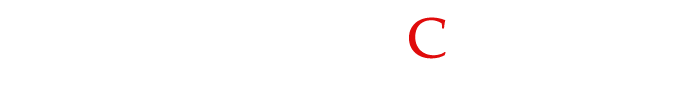좌파진영의 주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있다.
일제치하 한국에서의 여성의 삶
2006년 ‘광복 전후의 역사인식’ 1권 2부 주제는 ‘식민지 여성의 삶’이다.
오사카 산교대 후지나가 타케시 교수, 시카고대 최경희 교수,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서정희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 신문들을 보면 좌파진영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일본 연구는 심도 있고 한국 연구는 엉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정의기억협의회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적 주장을 하고 있어 외국 연구원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 통치의 마지막 10년(1935-1945)은 한국의 산업혁명과 같았습니다.
농민들이 땅을 떠나면서 노동계급이 등장하고 인구이동이 증가하며 도시사회가 일제히 확산되면서 이른바 신여성에 대한 열망이 여성들 사이에 퍼졌다.
1917년 이광수의 소설 ‘무조’가 신문에 연재되어 신문명의 대중적인 책이 되었다.
이 소설은 새로운 서구 문명이 유입된 시대, 열린 마음의 확산과 현대 소년 소녀의 탄생을 배경으로 젊은 남녀의 사랑 생활을 묘사했습니다.
1935년 심훈의 『상록수』가 출판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은 낡은 농촌사회를 열어준 계몽적인 책이었다.
위안부는 꽃이 만발한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위안부 19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따르면 탈농촌화 기간인 1937년에서 1944년 사이에 186명이 위안부가 되었다.
도시를 향한 골드 러시가 한창일 때 집을 떠나 도망친 이 소녀들은 인신매매자들의 쉬운 먹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안부 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분의 1 이상이 위안부가 되기 전에 도우미, 공장 노동자, 식당, 오키야 웨이트리스 등 집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약 60%가 만주, 대만, 중국으로 이송되어 위안부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 때문에 집을 가출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형제자매로부터 가정 폭력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어린 소녀는 인신매매 집단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청력에서 얻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그녀는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사회로 뛰어들었지만 거친 세상의 바다를 방황하던 중 인신매매단에 의해 희생됐다.
그것이 위안부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인신매매단의 부하들은 주로 조선인이었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조선인들도 많았다.
위안부가 되는 길은 ‘집→노동시장→위안소’와 ‘집→위안소’ 두 가지였다.
이 두 경로를 담당한 중개자는 인신매매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대 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のが, 가정 폭력과 딸에 대한 학대, 배움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려는 무지한 남성 중심의 문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위안부 광고는 잦았다.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을 초청하는 광고를 보고 스스로 가버렸고, 그들의 가난한 아버지들이 위안부를 많이 팔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사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