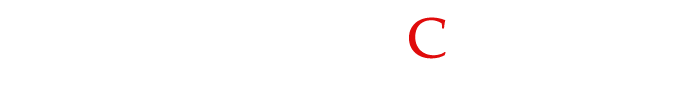합병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여행이 쉬워졌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병합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여행이 용이해지자,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노예)이 억압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17년 4월 1일
이 내용은 이전 장의 계속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합병 문제로 돌아가서, 두 나라 사이의 여행이 편리해지자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본질적으로 노예들—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대거 이주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적 계층 구분이나 인종 차별이 거의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차별이 더 강하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존재했던 엄격한 계급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장 낮은 계급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일본에서의 삶이 훨씬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그 노예들의 후손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처음부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고향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은 전쟁 후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별도로, 1948년 일본 패전 3년 후 공산주의 반란 중 섬 주민들이 학살당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언젠가 다루고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제주 주민들이 일본으로 피난했습니다.
저는 전직 섬 주민들로부터 직접 고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일본이 한반도 병합 기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남북한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인구의 귀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또한, 전후 GHQ(일반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한반도 출신 모든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1946년 3월까지 일본에 거주하던 약 140만 명의 한국인이 한반도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의 백정(불결한 계층)이나 하층민 지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 “징병을 피하고 싶다.”
-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 “일본은 부유하고 살기 편하며 차별이 거의 없다.”
주변에 노인 한국인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화 문제에 대해:
백정 계층 출신들은 적절한 가족 등록부(한국에서 jokbo라고 하며, 일본의 koseki와 유사함)가 부족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경우 개인이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특별 영주권자”는 이전에 필수적이었던 서면 “귀화 동기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역사, 일본에 어떻게 언제 도착했는지, 전쟁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현재 귀화 신청 과정에서 대부분 생략됩니다.
참고: http://www.asahi-net.or.jp/~fv2t-tjmt/dainijuunanadai